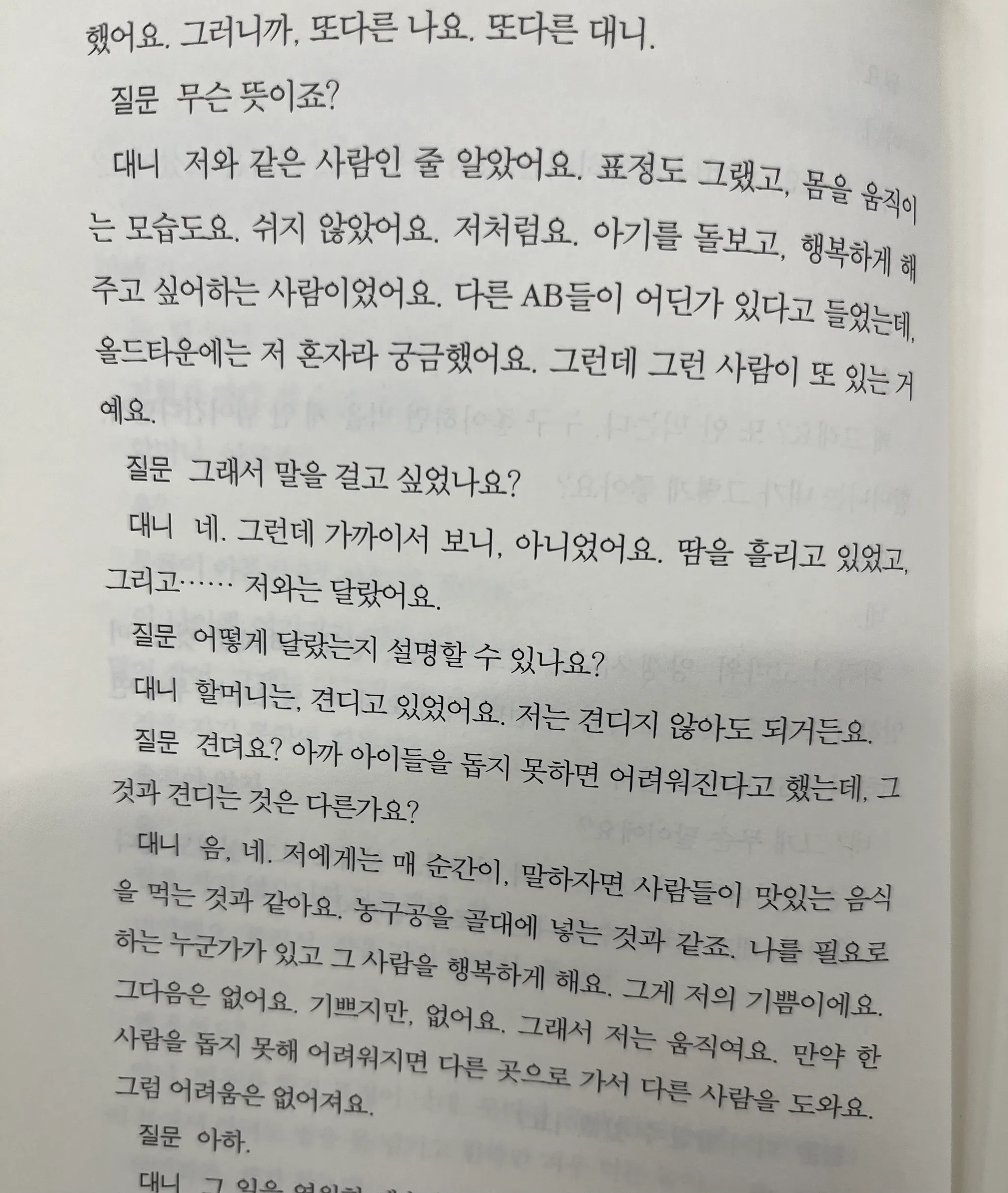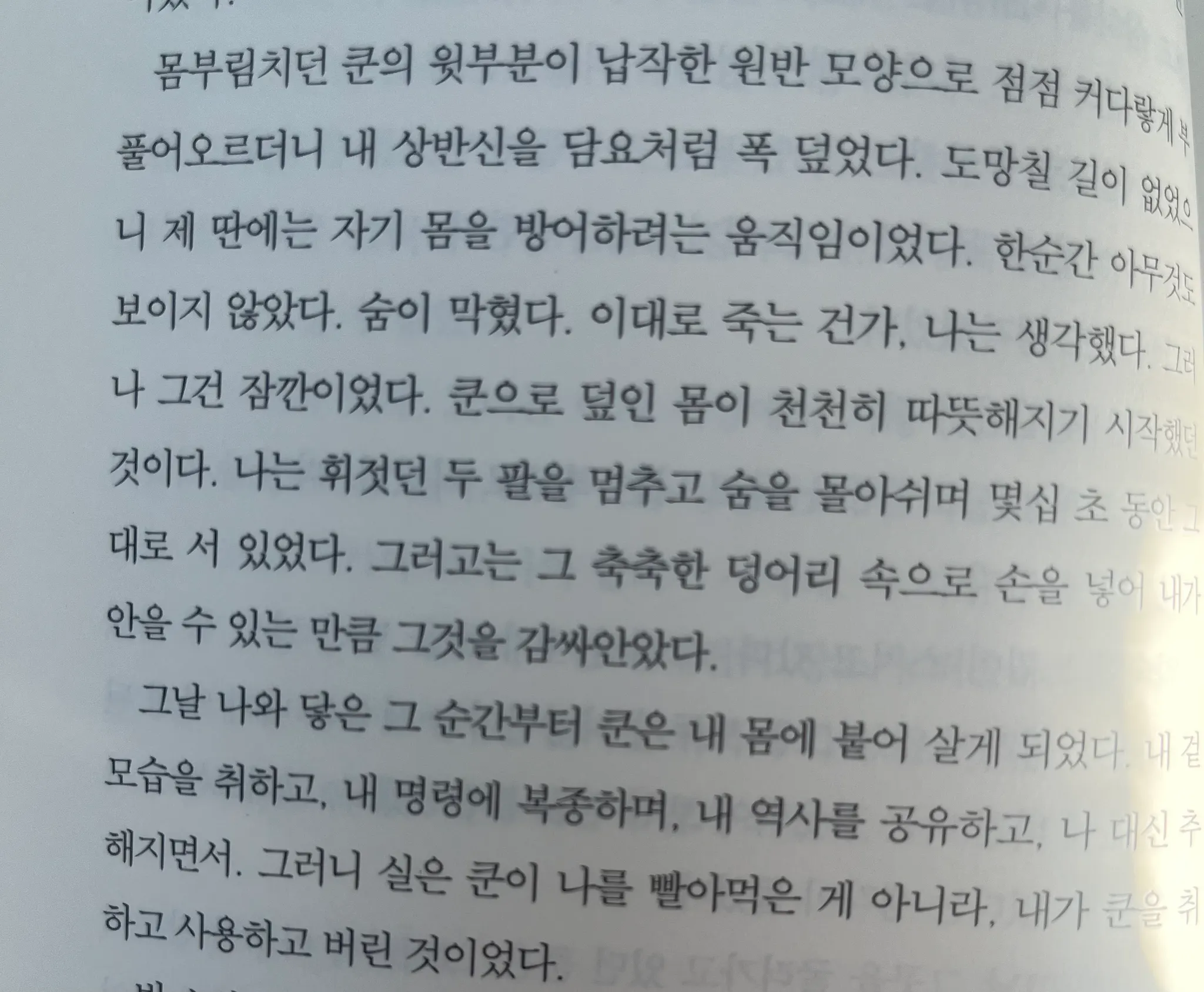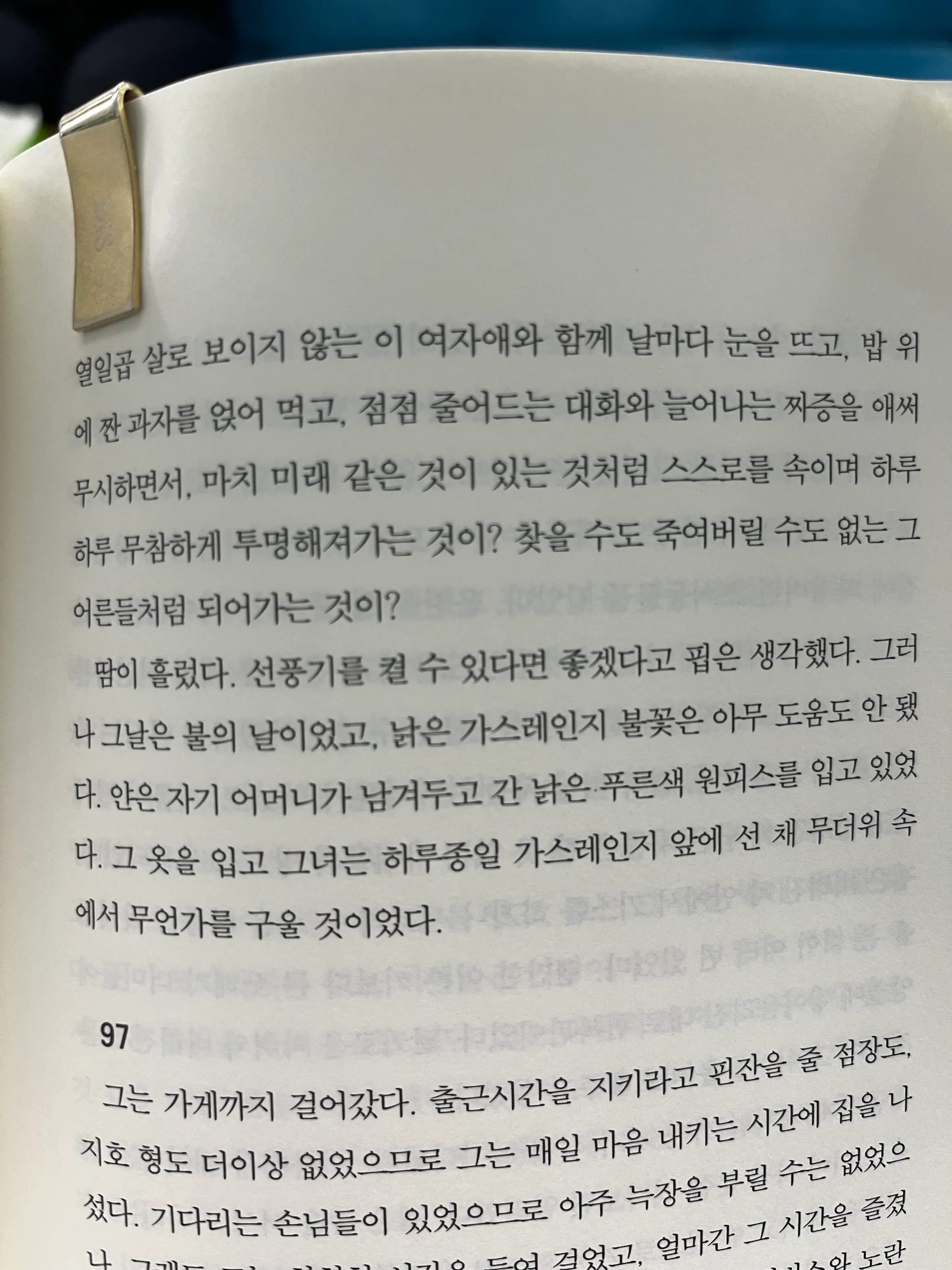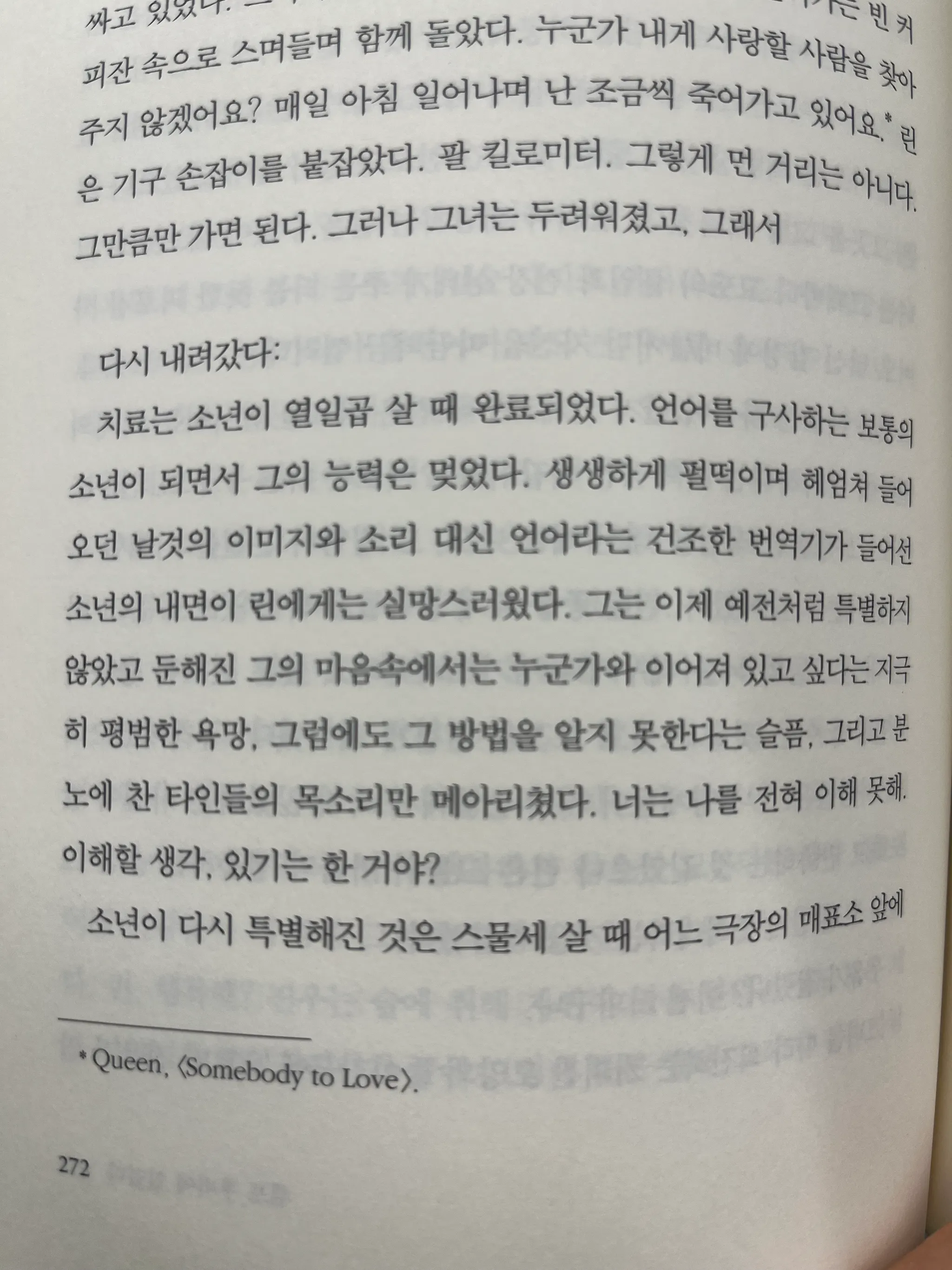09.30 월 ( 1 ~ 52 )
할머니는,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견디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간답다’는 말은 잔인하다.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헌신자를 보며, 우리는 정을 언급하며 인간답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사자에겐 고통의 연속이며, 이를 티내지 않고 견뎌내야 한다. 겉보기만 아름답고, 속은 썩어가는 것을 지켜야 하는가?
10.02 수 ( 52 ~ 112 )
그러니 실은 쿤이 나를 빨아먹은 게 아니라, 내가 쿤을 취하고 사용하고 버린 것이었다.
작중에서 ‘나’는 마흔 살까지 몸에 붙은 쿤을 드디어 떼어냈다고 말한다. 사실 이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원래의 모습은 거대한 쿤의 등에 작은 ‘나’가 매달린 것 같다. 즉, 신체의 비율을 고려할 때, ‘나’를 쿤에게서 떼어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쿤은 ‘겉으로 포장된 나’를 의미한다.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결국 진정으로 되고 싶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겉으로 포장된 나를 만든다. 하지만,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계속 존재한다. 그렇기에 ‘나’와 쿤을 같은 몸에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
쿤을 떼어낸 ’나‘의 몸은 중학생의 몸이 됐다. 거대한 쿤이 떨어져 나갔기에 몸의 힘은 훨씬 약해졌다. 하지만, 약해진 몸으로 이전에 놓친 일상을 쫓고, 연기를 배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준다. 우리도 쿤에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쯤 쿤을 떼어낼 수 있는가?
10.04 금 ( 112 ~ 204 )
마치 미래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 하루 무참하게 투명해져가는 것이? 찾을 수도 죽여버릴 수도 없는 그 어른들처럼 되어가는 것이?
어른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아 있는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아이가 있는 반면, 타인과 유대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자신들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설령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속이며 버티는 것임을. 약자들의 결속은 이처럼 작고 연약하다.
10.07 월 ( 204 ~ 280 )
생생하게 펄떡이며 헤엄쳐 들어 오던 날것의 이미지와 소리 대신 언어라는 건조한 번역기가 들어선 소년의 내면이 린에게는 실망스러웠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다. 타인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설령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생각을 알기 어렵다. 생각은 날 것이며, 목소리는 건조한 번역이다. 입 밖으로 내든, 속으로 내든 간에 목소리는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형식에 맞춰 언어로 번역한 것이며, 날 것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작중에서 사람들은 생명체의 마음을 읽는 길잡이 소녀를 경외하지만, 길잡이 소녀는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과 이어지기 위해선 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어라는 프레임 안에서 과연 가능할까?